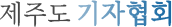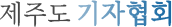|
[제주저널-5호] (2002년 5호 일반기사) [자유마당]칼의 노래
|
|
|
글쓴이 :
기자협회
작성일 : 2008-03-21 23:47
조회 : 831
|
HTML Document
제목:‘칼의 노래’
“내가 적을 이길 수 있는 조건들은 적에게 있을 것이었고, 적이 나를 이길 수 있는 조건들은 나에게 있을 것이었다. 임진년 개전 이래, 나는 그렇게 믿어왔다. 믿었다기보다는, 그렇기를 바랐다.”(이순신)
우리는 하루하루를 얼마만큼 긴장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이 해답을 이순신의 적나라한 실존적 세계관을 보여준 소설가 김훈의 장편 ‘칼의 노래’에서 찾고자 한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생활은 차치하고라도 언제 꽃이 피었는지 지었는지, 계절이 오는지 가는지 등등…지극히 평범한 이치도 깨닫지 못하고 하릴없이 흘러가는 일상만 탓하는 한낱 서생(書生)인 나를 참으로 오랜만에 책상 앞으로 끌어당긴 소설이다.
잘 알다시피 ‘칼의 노래’는 충성심으로 가득 찬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의 생애를 허망함과 싸우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낸 장편소설이다.
4백년이 지난 지금 이순신은 세계 해전사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승을 거둔 명장이고 영광의 정점에서 장렬히 전사함으로써 완결되는 영웅이다.
그러나 소설은 이순신이 백의종군을 시작할 무렵부터 그가 물러가는 적의 전면에 자신의 육신을 내던져 전사하기까지 삶과 임진왜란 당대의 사건들이 겹을 이룬다.
작가는 우리 역사가 가질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무오류의 영웅인 이순신의 드러나 있는 괘적을 실증적으로 복원하되, 신화로 남은 자의 내면까지 형상화하려 애쓰고 있다.
모국어가 도달할 수 있는 산문 미학의 한 진경을 보여주고 있는 작가는 철저한 이순신 자신의 1인칭 서술로 일관된 시점을 통해 전투 전후의 심경, 혈육의 죽음, 여인과의 통정, 정치와 권력의 무의미와 그것의 폭력성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생사를 책임진 무장으로서 고뇌, 죽음에 대한 사유, 문과 무의 멀고 가까움, 꼼꼼한 전투 준비와 전투 와중의 급박한 상황, 풍경과 무기, 밥과 몸에 대한 사유들로 그것들을 채색하고 있다.
여기서 이순신은 칼의 삼엄함과 무의 단순성이 최고조로 발현된 개념적 인간이다.
전장터에서 허무와 비리의 세상과 싸웠던 무장 이순신.
그래서 긴장과 열정은 닮은꼴이다.
때문에 작가는 이 글쓰기를 통해 우리가 충무공에 대해 가지고 있던 국가, 민족, 종묘사직 등의 상투적 관념을 여지없이 깨뜨리며 소설에 대한 열정을 계속한다.
작가 김훈은 일간지 문학담당 기자로 이름을 날리다 이 소설로 주목받는 작가로 거듭났다. 그의 문장은 더없이 짧고 간결하고 속도감 있고 주어와 동사만의 단문으로 한권의 장편을 만들어냈다.
그에게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녔을 ‘문학담당 기자’라는 꼬리표를 한순간에 떼어낸 이 소설을 통해 전투에 임하는 무장으로서의 숨막히는 긴장감을 읽어냈다면 지나친 평가일까. 그저 ‘문학담당’을 했던 기자의 소설이라는 점이 낯선 것은 아니다.
그것은 지극히 우연한 일일 뿐 소설 속에나 그의 또 다른 산문 속에 부과되어 나타나지는 않는다.
적군 포로를 생포해 심문하던 중 아산에서 아들 면을 죽인 스물세 살의 젊은 병사로우연히 밝혀지자 순신의 칼은 징징징 소리내어 울었다. 살려주자. 살려두어서는 안된다. 살아서 돌아가게 하자…그러나 순신은 손수 그를 벤다.
단칼에 베어버리는 무인된 자의 긴장을 통해 우리가 애써 배울 점은 무엇일까.
적어도 기자된 자로서 하나의 사실(Fact)을 중언부언하지 않고 전달하고자 하는 펜과 이 같은 무인된 자의 칼의 깊이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담론이 사라진 이 시대. 양분화, 양극화한 현실에서 들어갈 최소한의 공간도 말라 비틀어진 시대.
이 시대에 사실을 가진 자들과 최소한 진실을 향해 열린 자들의 실존은 과연 무엇일까.
“칼은 한 번 긋고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다. 그을 때마다 생사가 명멸했으니…”
글쓰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이 시대에 던지는 화두다.
|
|